HOME > 건설·교통 관련콘텐츠 > 에너지 낭비량, 제로에 도전한다 건축의 현명한 미래,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란 보통 냉방과 난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당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냉방과 난방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탄생된 개념으로, 태양열 흡수 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대응하는 건축이다. |
| 현재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주택이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패시브 건축의 개념이 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생소한 실정이다. 과연 앞으로 국내에서 패시브하우스 주택이 대중화될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의 패시브하우스 건축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예측해보도록 하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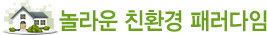 |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은 1988년 스웨덴의 보 아담슨 교수와 독일의 볼프강 페이스트 교수의 연구를 통해 처음 탄생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면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급증하자 1990년 다름슈타트에 최초의 주거용 패시브 하우스가 건설되었다. 1996년에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기준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패시브 하우스는 본격적으로 독일과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은 1988년 스웨덴의 보 아담슨 교수와 독일의 볼프강 페이스트 교수의 연구를 통해 처음 탄생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면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급증하자 1990년 다름슈타트에 최초의 주거용 패시브 하우스가 건설되었다. 1996년에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기준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패시브 하우스는 본격적으로 독일과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패시브하우스를 지을 땐 남향(南向)으로 크고 작은 창을 많이 내고, 실내의 열을 보존하기 위하여 3중 유리창을 설치한다. 단열재는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 이상을 설치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열 손실을 막는다. 이러한 과학적 설계 덕분에 패시브 하우스는 그 어떤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겨울에 실내온도 약 20℃를, 한여름엔 약 26℃를 유지할 수 있다. |
 |
| 패시프 하우스는 흔히 쓰이는 ‘에코 하우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에코 하우스는 자원의 절약에 중점을 둔 건축으로, 빗물을 받아서 식수 이외의 허드렛물로 사용한다거나 세안 혹은 세탁 시 가볍게 사용된 물을 일정 절차의 여과를 통해 변기 세척에 다시 이용하는 등 자원 재사용에 집중된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
| 반면 패시브 하우스는 자원 절약보다는 인위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연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최대한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경사지붕과 처마를 이용해서 겨울의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여름의 더운 공기는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
 |
 하이델베르그에 위치한 반 슈타트(Bahn- stadt) 복합단지는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거, 사무, 산업, 상업, 과학, 교육 복합단지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설계된 패시브하우스 마을이다. 도시 개발은 아직 미완성이나 이미 주민과 기업 연구소를 비롯해 현재 2천 5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특수 단열재와 이중구조 창문, 하이테크 여과시스템 및 공기순환장치 등을 통해 일반 타 건축물보다 90% 에너지를 절감 중이다. 하이델베르그에 위치한 반 슈타트(Bahn- stadt) 복합단지는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거, 사무, 산업, 상업, 과학, 교육 복합단지 건설계획을 기반으로 설계된 패시브하우스 마을이다. 도시 개발은 아직 미완성이나 이미 주민과 기업 연구소를 비롯해 현재 2천 5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특수 단열재와 이중구조 창문, 하이테크 여과시스템 및 공기순환장치 등을 통해 일반 타 건축물보다 90% 에너지를 절감 중이다.
참고로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정부와 시의 지원 아래 주택의 2%를 패시브하우스로 신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시 소유의 270개 건물의 경우, 센서를 달아 15분마다 에너지사용량이 체크되고 있다. |
 |
 런던 남단에 위치한 베딩톤 제로 에너지 단지(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환경 컨설턴트 회사인 바이오리즈널 리클레임드와 건축가 빌 던스터가 최대한의 에너지를 절약하며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한 마을이다. 이 곳은 현재 82개의 아파트주택, 복층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복지회관과 탁아소를 포함한 작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20도 기울어진 남향으로 지어졌고, 삼중으로 된 지붕의 채광창이 실내로 들어온 고에너지의 일광을 오랫동안 보존시킨다. 런던 남단에 위치한 베딩톤 제로 에너지 단지(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환경 컨설턴트 회사인 바이오리즈널 리클레임드와 건축가 빌 던스터가 최대한의 에너지를 절약하며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한 마을이다. 이 곳은 현재 82개의 아파트주택, 복층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복지회관과 탁아소를 포함한 작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20도 기울어진 남향으로 지어졌고, 삼중으로 된 지붕의 채광창이 실내로 들어온 고에너지의 일광을 오랫동안 보존시킨다. |
 |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Innsbruck)에 들어선 패시브하우스는 6층짜리 건물 6개 동으로 구성된, 354 가구가 사는 임대 아파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 이 곳은, 섭씨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도 실내 온도 영상 24도를 유지시키는 난방비로 겨우 2만5000원을 지출한다. 아파트 벽과 천장 단열재 두께는 각각 30㎝, 26㎝로 한국의 일반 아파트보다 4~5배 두꺼우며, 문틈·창틈에는 단열 테이프가 부착되어 외부의 냉·열기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다. 또한 외부 공기는 아파트 정원에 세워놓은 철제 환기통을 통해 지하수관 옆을 지나며 따뜻해져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Innsbruck)에 들어선 패시브하우스는 6층짜리 건물 6개 동으로 구성된, 354 가구가 사는 임대 아파트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 이 곳은, 섭씨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도 실내 온도 영상 24도를 유지시키는 난방비로 겨우 2만5000원을 지출한다. 아파트 벽과 천장 단열재 두께는 각각 30㎝, 26㎝로 한국의 일반 아파트보다 4~5배 두꺼우며, 문틈·창틈에는 단열 테이프가 부착되어 외부의 냉·열기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다. 또한 외부 공기는 아파트 정원에 세워놓은 철제 환기통을 통해 지하수관 옆을 지나며 따뜻해져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
 |
| 물론 패시브 하우스에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인 집보다 단열재에 손이 더 많이 가는 탓에 건축비용이 일반 주택에 비하여 1㎡당 5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번의 시공으로 지속적인 냉난방비 절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크기의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경우, 주택의 건축비와 에너지 효율을 환산했을 때 약 10년 정도 후면 추가 건축비를 만회할 수 있다고 한다. |
| 2008년 8월 우리나라 정부는 '그린 홈(Green Home) 100만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사실상 자급하는 친환경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친환경 목표가 수립된 만큼, 우리나라도 저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지원하는 보조금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의 기술력이 담긴 패시브 하우스가 국내 곳곳에서 활발히 사랑받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자료
|